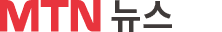[MTN현장+] 한국은행의 진한 감독권 향수
김이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국내 은행권에 비보가 날아왔다. NH농협은행 뉴욕지점이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기준을 이행하지 않아 대규모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 거란 소식이다.
2014년 유럽계 은행에 10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미국 금융당국이 이제 아시아계 은행을 겨냥하고 있다는 설이 파다해지면서 지난 10월말에는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직접 뉴욕 연방은행(Fed)를 방문해 불길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사건 전말은 이렇다. 올초 뉴욕 연방준비은행과 뉴욕 금융감독청(DFS)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 관련 합동 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두 기관에서 각기 다른 별도 조치가 내려졌다. 연방은행은 규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차원인 '서면 합의' 조치를 내렸고, 월가 저승사자로 불리는 DFS는 대규모 벌금형을 내리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이다. 벌금 규모만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나라로 치면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의 공동 조사를 받고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해석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금감원과 한은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공동검사를 벌일 수 있지만 감독 결과에 따른 제재 권한은 금감원에게만 주어진다. 한은은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청할 수는 있어도 단독 검사 시행은 불가능하다. 당연히 제재도 권한 밖의 일이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방예금보호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등 감독당국이 여러 곳이지만, 우리는 금감원으로 감독기능이 통합돼 중앙은행임에도 단독 조사가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본래 한국은행 안에 은행감독원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감독당국 위기대응력을 키우자는 취지로 금융산업별로 분산돼 있던 감독기구를 통합시키기로 했고, 1999년 금융감독원이 출범하게 됐다.
감독기능은 자연히 금감원에게 넘어갔지만, 한은은 감독권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정책을 다루는 기관이 넘쳐나지만 단일 금융회사 상대로 소위 '끗발'이 서는 카드는 역시 감독 권한이기 때문이다. 한은의 줄기찬 감독권 요구에 2002년부터 금감원은 한은과 공동검사 양해각서를 맺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2011년 김중수 한은 전 총재 시절에는 단독감독권을 놓고 금감원과 맞붙기도 했다. 중앙은행도 단독 조사 기능을 가져야 한다면서 감독권을 독점하고 있던 금융위·금감원에 선전포고를 날린 것이다.
특정 금융사나 은행에 긴급 유동성 공급이 필요할 경우가 생기면 중앙은행이 먼저 나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명분이었다. 결과는 한은법 개정안에서 단독조사권 내용이 빠지면서 사실상 한은의 패배로 끝났다.
한은과 금감원 사이 갈등은 '출연금'을 통해 분출되기도 했다. 한은은 금감원 설립과 동시에 정착 지원 목적으로 지금까지 해마다 출연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출연금은 1999년 첫해 약 400억원에서 시작한 뒤 점차 낮아져 2006년부터 100억원으로 고정됐다.
한은의 출연은 금감원 자료 활용과 공동검사에 따른 인력지원 비용을 고려한 결정이기도 했다. 한은 관계자는 "과거 금감원에 자료 정보를 요청해도 받기가 쉽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며 "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한 뒤에야 여건이 나아졌다"고 말했다.
2010년에는 한은법 개정 이슈로 금감원과 마찰을 빚으면서 한은이 돌연 출연금 지원중단을 결정한 적도 있고, 금감원이 출연금을 250억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해 서로 몇번이나 충돌하기도 했다.
한은과 금감원의 감독권 기싸움은 이주열 한은 총재 부임 이후 한층 사그러진 분위기다. 이주열 총재는 김중수 전 총재와 달리 감독권 문제로 금융당국과 정면으로 날을 세우진 않았지만 대신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 중앙은행이 물가안정 뿐 아니라 '금융안정'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감독권 요구를 유화적으로 표현해왔다.
현재 정부의 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기와 맞물려 한은이 좀더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 총재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만큼 공은 후임 총재에게 넘어가게 됐다. 친척뻘인 두 기관의 기싸움이 재현되기라도 할까. 분명해보이는 건 한은의 감독권 향수는 잠자고 있을 뿐 사라지지 않은 것 같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iseul@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