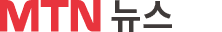[최남수칼럼] ‘런던의 깃발’을 경제로!
최남수 보도본부장
 이번 30회 하계 올림픽이 열린 런던. 지난 1908년의 4회 대회, 1948년의 14회 대회에 이어 올림픽이 세 번씩이나 열린 유일한 도시이다. 당초 40km였던 마라톤의 경주 거리를 영국 왕실의 편안한 관람을 위해 42.195km로 바꿨던 곳이기도 하니 ‘올림픽 도시’로서의 위세가 대단하다.
이번 30회 하계 올림픽이 열린 런던. 지난 1908년의 4회 대회, 1948년의 14회 대회에 이어 올림픽이 세 번씩이나 열린 유일한 도시이다. 당초 40km였던 마라톤의 경주 거리를 영국 왕실의 편안한 관람을 위해 42.195km로 바꿨던 곳이기도 하니 ‘올림픽 도시’로서의 위세가 대단하다.런던은 공교롭게도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첫 출전한 14회 대회가 열린 곳이기도 하다. 당시 우리나라의 첫 성적표는 복싱과 역도에서 따낸 동메달 두 개. 그로부터 64년이 흘렀다. 눈부신 변화를 우리는 보고 있다.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로 28개의 메달을 거머쥐었다. 종합순위 세계 5위. 신흥 경제 강국이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위상도 과시했다. 런던에서 전해온 한국선수단의 연이은 승전보는 풀 죽은 경제와 찌는 듯한 무더위에 지친 국민들의 가슴에 희망의 불을 지피기에 충분했다.
한국 스포츠의 이같이 강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필자 나름대로 그 원인을 찾아보고 우리 경제에 던져주는 시사점을 찾아보려 한다.
먼저, 강력한 인센티브 시스템. 우리 사회에선 공부가 신분 상승의 활발한 통로가 되던 시절이 있었다. 말 그대로 개천에서 많은 용들이 나왔던 시기이다. 문제는 평준화와 경제 양극화의 심화 등 요인에 따라 이제는 이 ‘교육의 문’이 좁아졌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스포츠가 스스로 열심히 해서 사회적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계속 해내고 있다. 비닐하우스 단칸방에서 사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놀라운 기술로 ‘도마의 신’의 위치에 오른 양학선의 스토리는 ‘개천에서 난 용’의 꿈을 여전히 가능하게 하고 있다.
국가가 주도하는 ‘엘리트 체육주의’와 시장의 조화도 중요한 요인이다. 정부는 스포츠 엘리트를 앞장 서 육성하는 제도를 가동해왔으며.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쌍두마차’의 역할을 해왔다. 여기에 경제적 동기가 부여되는 시장 원리도 가세했다. 동호회 중심의 ‘겸직형’ 스포츠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생계를 건 ‘전업형’ 스포츠 선수가 대부분이다. ‘한국 스포츠엔 아마튜어가 없고 다 프로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한 국내 선발전 자체가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치열한 경쟁인데다 메달 획득 시 상당한 보상이 제공되는 체계도 스포츠 강국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넘버 원(Number One)'사회에서 ’온리 원(Only One)‘사회(이어령 전 문화부장관이 만든 용어)로의 변화도 빼놓을 수 없는 흐름이다. 모든 사람을 줄 세워 일등, 일류만을 획일적으로 추구하던 사회에서 이젠 각자 좋아하는 분야에서 자신만의 특장으로 고유한 영역을 만드는 다양성의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펜싱과 체조 등의 약진에서 이런 흐름이 뚜렷하다. 운동 자체를 즐기며 하는 젊은 ’스포테이너‘들이 이젠 선수단의 주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끝으로 노장의 조화도 돋보인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30대 노장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금메달의 주인공들인 사격 2관왕 진종오(33), 남자 유도 90kg급의 송대남(33), 양궁 남자대표팀 맏형 오진혁(31)를 비롯해 펜싱과 배트민턴, 탁구에서 30대들의 선전은 후배 선수들에게 귀감이 됐다.
정부와 시장이 서로를 압도하지 않으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관민 협업의 구조, 강한 동기부여를 하면서 성장의 원천을 다양화하며 세대간 이해 폭을 넓히는 경제. 런던 올림픽에서 경제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경제도 올림픽만 같아라’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