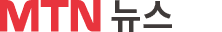[MTN 현장+]중국보다 뒤진 전자증권제도, 언제까지...
이명재 기자
종이로 된 실물증권없이 전자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사실 전자증권제도는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라 10년 전부터 이슈화가 됐었다. 최근 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종걸 의원 측이 전자증권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느껴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했고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면서 진행이 구체화됐다.
전자증권제도는 미국과 영국 일본 등 OECD 34개국 중 31개국이 채택했으며, 중국도 1993년부터 이미 실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자증권제도는 왜 필요한 걸까.
먼저 예당엔터테인먼트 사건을 얘기해보자.
지난해 자금난에 봉착한 예당엔터테인먼트 대주주가 장부상 계좌부에 있는 자회사의 주식 수백만주를 실물로 출고해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가 갚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급기야 자살을 선택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채업자는 그 주식을 증권시장에 헐값으로 내다팔았고, 소액주주들은 영문도 모른채 주가가 폭락해 피해를 봤으며 결국 회사는 상장폐지까지 됐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주주가 언제든지 실물증권(종이증권)을 반환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 전량을 손쉽게 빼내 불법으로 주식담보대출에 이용한 것이다.
두번째로 지난해 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을 위변조해 100억원을 횡령한 일이 있었다. 이 사건은 은행의 주택기금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점을 틈타 일부 직원들이 공모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채권의 원리금을 빼돌렸다. 즉 종이 형태로 유통 및 거래된다는 점을 노린 범죄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실물증권은 주가조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주가조작범들은 계좌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오직 사는 것만 한다. 예를 들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의 계좌로 산 주식을 실물로 출고한 뒤 증권시장이 아닌 장외에서 팔고 그 돈을 대포통장으로 받는 식이다. 주가조작을 잡으려면 사고 판 내역을 찾아야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산 기록만 남아 추적이 불가능하다. 또 판 돈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될 경우 장외에서 파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팔더라도 전자등록을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찾아낼 수 있다.
이처럼 주식과 채권, 기업어음 등 각종 실물증권들이 온갖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주주가 실물증권으로 언제든지 뺄 수 있어 거래들이 장부상에 드러나지 않아 바로 파악이 어렵다"면서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될 경우 실물로 유통을 할 수 없고 질권설정도 계좌부상에서만 가능하며, 주식도 담보설정 내역들이 다 잡히기 때문에 범죄가 줄어드는 건 물론 투자자도 보호된다"고 말했다.
여러가지 장점이 많은 전자증권제도는 2017년 도입될 예정이지만 관련법 개정 등 남은 과제가 많아 얼마나 미뤄질 지는 알 수 없는 상황. 더 우려되는 건 그때까지 각종 범죄가 여전히 판을 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은 범죄를 예방하고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증시를 떠나버린 투자자들의 생각이 바뀔 것이다. 증권업계는 연간 1천억원의 불필요한 발행과 유통비용 등을 줄일 수 있어 운영상 효율성이 증대된다.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여러가지 정책들이 앞다퉈 시행되고 있지만 누이좋고 매부좋은 이 제도 도입에 정부가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하는 게 아닐까싶다.
사실 전자증권제도는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라 10년 전부터 이슈화가 됐었다. 최근 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종걸 의원 측이 전자증권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느껴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했고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면서 진행이 구체화됐다.
전자증권제도는 미국과 영국 일본 등 OECD 34개국 중 31개국이 채택했으며, 중국도 1993년부터 이미 실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자증권제도는 왜 필요한 걸까.
먼저 예당엔터테인먼트 사건을 얘기해보자.
지난해 자금난에 봉착한 예당엔터테인먼트 대주주가 장부상 계좌부에 있는 자회사의 주식 수백만주를 실물로 출고해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가 갚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급기야 자살을 선택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채업자는 그 주식을 증권시장에 헐값으로 내다팔았고, 소액주주들은 영문도 모른채 주가가 폭락해 피해를 봤으며 결국 회사는 상장폐지까지 됐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주주가 언제든지 실물증권(종이증권)을 반환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 전량을 손쉽게 빼내 불법으로 주식담보대출에 이용한 것이다.
두번째로 지난해 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을 위변조해 100억원을 횡령한 일이 있었다. 이 사건은 은행의 주택기금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점을 틈타 일부 직원들이 공모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채권의 원리금을 빼돌렸다. 즉 종이 형태로 유통 및 거래된다는 점을 노린 범죄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실물증권은 주가조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주가조작범들은 계좌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오직 사는 것만 한다. 예를 들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의 계좌로 산 주식을 실물로 출고한 뒤 증권시장이 아닌 장외에서 팔고 그 돈을 대포통장으로 받는 식이다. 주가조작을 잡으려면 사고 판 내역을 찾아야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산 기록만 남아 추적이 불가능하다. 또 판 돈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될 경우 장외에서 파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팔더라도 전자등록을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찾아낼 수 있다.
이처럼 주식과 채권, 기업어음 등 각종 실물증권들이 온갖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주주가 실물증권으로 언제든지 뺄 수 있어 거래들이 장부상에 드러나지 않아 바로 파악이 어렵다"면서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될 경우 실물로 유통을 할 수 없고 질권설정도 계좌부상에서만 가능하며, 주식도 담보설정 내역들이 다 잡히기 때문에 범죄가 줄어드는 건 물론 투자자도 보호된다"고 말했다.
여러가지 장점이 많은 전자증권제도는 2017년 도입될 예정이지만 관련법 개정 등 남은 과제가 많아 얼마나 미뤄질 지는 알 수 없는 상황. 더 우려되는 건 그때까지 각종 범죄가 여전히 판을 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은 범죄를 예방하고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증시를 떠나버린 투자자들의 생각이 바뀔 것이다. 증권업계는 연간 1천억원의 불필요한 발행과 유통비용 등을 줄일 수 있어 운영상 효율성이 증대된다.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여러가지 정책들이 앞다퉈 시행되고 있지만 누이좋고 매부좋은 이 제도 도입에 정부가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하는 게 아닐까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