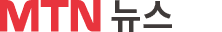[최남수칼럼] ‘재즈 경제’의 길
최남수 보도본부장
 “국가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가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So what? (그래서요?). 우린 여전히 살기 어려운데”
“재정도 건전하고 경기 회복 속도도 빠릅니다.”
“So what?"
종점을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은 현 정부를 서민들 입장에서 표현해보자면 “So what?"이 아닐까 싶다. 정부가 어떤 성과를 내세우든지 서민들은 아랫목에 온기가 돌지 않아 박한 점수를 주고 있다.
CEO 출신 대통령에 대한 기업들의 평가 또한 썩 좋지 않다. 기업을 잘 아는 대통령이어서 기대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규제의 전봇대를 뽑기보다는 여기저기에 다시 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아는 사람이 더 한다’는 푸념이 터져 나왔다. 특히 시장원리를 외면한 밀어붙이기 식 행정엔 혀를 내둘렀다. 툭하면 통신사에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요금 인하를 강요했다. 휘발유값은 어떤가? 장관이 회계사라고 다 뒤져보고 가격을 내리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타당한 근거도 없이 일정 금액을 한시적으로 내려 소비자 혜택보다는 정부 체면만 챙기는 모양새를 보여줬다. 전기 요금도 마찬가지. 해당 기업이 상장 회사인 데다 원가에도 못 미치는 요금으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요금 정상화에는 소극적이다. 제조업체들조차 가격 조정을 할 때는 정부 눈치를 보고 있다. 시내버스 요금조차 정부가 관리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 시절로 회귀한 듯한 모습이다.
정부로서야 서민생활의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왔다. 하지만 가격이 온도계 역할을 하는 시장원리를 망가뜨리는 것 또한 문제다. 가격에 의해 수요와 공급의 양이 조절되고, 가격이 원가를 반영하는 시장원리는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 자본주의라는 게 가격이라는 등대를 보고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가는 울타리가 아니던가.
최근 대선에서 불거진 경제민주화 논란을 보면 자본주의의 이런 기본적 인프라까지 더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커진다. 시장 실패를 바로잡는다는 간판 아래 규제의 기운이 지나치게 몰아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따져 보자. 역사적으로 경제는 시장과 정부가 서로 바통을 주고받으며 가는 순환주기의 과정에 놓여 있을 뿐이다. 시장이 흥하다 부작용이 누적되면 정부가 나서고, 다시 정부 실패의 폐해가 커지면 시장이 해결사로 나서는 반복적 과정을 밟아온 것이다. 시장과 정부, 둘 다 절대적 해답은 아니며 장점과 결함을 다 지니고 있다. 역사의 한 시기에 누구에게 ‘등판의 기회’가 주어지느냐가 정해질 뿐. 시장의 실패를 발판으로 규제가 과속하는 것을 경계해야 할 이유이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최근 저서, ‘누구를 위한 미래인가’에서 진단한다. “지금의 상황은 경기 침체가 아니다. 사회의 기술경제적 구조가 총체적으로 재편성되고 있는 과정이다” 산업화 시대의 ‘제 2의 물결 경제’가 정보와 지능 중심의 ‘제 3의 물결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의 진통이라는 말이다. 필자의 말로 바꿔 말하면, 과거의 경제는 정부가 지휘자가 되고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악보 그대로 연주하는 ‘클래식 경제’였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경제는 기본 악보만 공유하고 나머지는 단원들이 알아서 창의적으로 연주하는 ‘재즈 경제’이다. 돈이 아니라 창의와 혁신이 자본이 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대의 향도는 규제가 아니라 자율이다. 정부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역할에 머물면서, 민간의 활력과 창의성이 활짝 피도록 고삐를 상당부분 놓아야 한다. 12월 대선에서 누가 새 대통령이 되던 ‘정부는 살짝 참견만 하라’는 내용의 ‘넛지’를 일독해볼 것을 권한다. 어차피 규제도 넘치면 경제엔 독약이다.